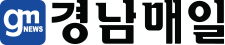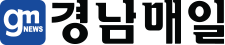월중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외환 당국의 공격적인 시장 개입 탓이다.
물론 초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와 줄기차게 지속되는 외국 자본의 한국 이탈도 한몫 거들고 있긴 하나 정부의 강력한 환율 안정 의지가 가장 큰 원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성장에 대한 조급증으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고환율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환율과의 전쟁’에 안간힘을 쏟는 배경에는 물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같은 자원빈국은 경제구조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매우 취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석유와 곡물 시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고환율정책을 추구했으니 물가가 치솟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원자재 시세 폭등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인데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것도 그래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연간 물가 상승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5%가 올라 30개 회원국 평균인 4.4%보다 1.1% 포인트나 높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서방 선진 7개국(G7)’의 4.1%와는 격차가 더 난다.
한국의 올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작년 동기(2.4%)의 두 배로 껑충 뛰었지만 OECD 평균은 2.4%에 3.9%로 오르는 데 그쳤다.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고 고환율을 유지한 탓으로 석유와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분보다 국내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뒤는게나마 정책 목표를 성장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나 시행착오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고환율정책으로 억지로 끌어올렸던 환율을 다시 억지로 끌어내리려다 보니 대규모 시장 개입이 불가피했다.
덕분에 환율 쏠림 현상은 일단 진정됐지만 ‘외화 곳간’이 많이 축났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아직도 2,50
0억달러에 이르므로 걱정거리가 못 된다며 태연한 입장이지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외환보유액을 빼 쓰다 보면 그 악몽의 환란이 다시 닥치지 말란 법도 없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투기세력들이 앞다퉈 집중 공세를 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계 6위의 외환대국이라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4년 반 전의 역외선물환(NDF)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시장의 신뢰 상실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정부를 믿고 따를 어리석은 시장은 없다.
고환율정책이 잘못이었다면 지금의 시장 개입은 거기에 덧칠을 입히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환율을 멋대로 올리고 내릴 자신이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일시적인 이상기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개입)에 그쳐야 한다.
외환 당국은 의연함을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