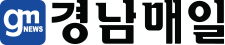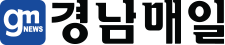어떤 일의 진전이나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한다. 삼일운동은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곧 대통령 선거도 역시 역사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온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산맥(山脈)`은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 `교토 분지로`의 <조선의 산악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다시 한국의 교과서인 <한국지리>에 일본인 `야스 쇼에이`가 재집필해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산맥으로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일제식민 잔재다. 19C 초 고산자 김정호(1804~1866)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분수령(分水嶺)이란 용어가 나오지만 산맥(山脈)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산맥이란 용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데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중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 등에도 산맥이란 용어는 없고, 다만 `분수령`이란 지명만 나오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발문에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산자분수령은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않고, 산이 곧 물을 나눈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토를 이해하는 방식은 `산맥(山脈)`이 아니라 `대간(大幹)`, `정간(正幹)`, `정맥(正脈)`이다. 2014년의 <가야의 발전>에 보면 가야 후기의 전성기에는 소백산맥을 서쪽으로 넘어 `<호남정맥(湖南正脈)>` 이라고 기술했다. 따라서 `산맥`을 쓰지 말고 `정맥`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결정적 순간, 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때 물[水銀]로 이용한다. 이 전환점을 정점(頂點), 분수점(分水點), 분수령(分水嶺), 분수계(分水界)라 말하며, 또는 산등성이라 한다. 이를 원용해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되는 고비`를 비유해 분수령이라 말한다. 항일시기 시인 이용악(李庸岳, 1914~?)도 1937년에 <분수령(分水嶺)>이란 시집을 내어 산맥을 대신했다.
분수령은 물이 둘 이상의 수계를 만들어지는 극적 표현이다. 인생의 삶 속에서도 다 같이 섞여 살지만 언젠가는 물이 갈라지듯 사람도 갈라져야 할 때가 온다. 이때 좋은 의미의 분수와 나쁜 의미의 분수가 있다. 자식이 결혼해 분가(分家)하는 것, 사업이 잘돼 분점(分店)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결혼해 이혼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아픔은 대단하다. 지금은 정국 분수령이다. 이에는 승패가 있어 상처가 대단한 분수령을 넘어야 한다. 어차피 분수령으로 골을 이어 내[川]을 이룰 것이니 미리 산맥 아닌 정맥으로, 정맥 아닌 분수령으로 가는 갈림길이라 생각하고 악의(惡意)아닌 선의(善意)의 분수령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