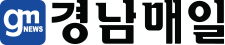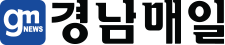숲 그늘에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리여리한 별꽃, 노란 애기똥풀, 보랏빛 각시붓꽃이 눈에 띄었다. 오글오글 모여 핀 현호색도 보였다. 방향 표지판 위에 앉았던 새 한 마리가 포로롱 높은 나무로 날아올랐다. 정상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 양옆에는 연둣빛 새순과 철쭉이 붉게 어우러져 비밀의 화원 같았다. 붕붕거리는 벌들을 헤치고 정상에 오르니 먼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단체 등산객들, 자연과 하나가 돼 버린 듯한 고독한 산책자들, 종달새처럼 지절대는 연인들,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단연 필자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였다. 햇볕에 그을려 볼이 발개진 아이들의 모습은 지친 기색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어떻게 이 벅찬 산길을 아이들과 함께 오를 생각을 했을까. 가까운 놀이동산 대신 등산로를 택한 부모들의 양육 모습이 궁금해 하산 속도를 맞췄다. 용추계곡에는 11개의 다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난 폭우에 쓸려갔는지 여러 개의 다리가 유실된 상태였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상관없는 듯했다. 가끔씩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도 하면서 엉성하고 미끄러운 돌무더기나 징검다리들을 지나 물 흐르듯 유연하게 내려가는 것이었다. 부부는 가끔씩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는지 돌아볼 뿐 별 말이 없었다. 간간이 손짓으로 아이들을 불러 함께 나무를 만져보거나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다. 쉼터에서 간단한 간식 후, 쓰레기를 챙겨 넣은 아버지가 배낭을 메면서 “출발!”하고 신호를 하자 아이들은 겅중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1차 고사가 끝난 오후, 전교생을 데리고 학교 뒤 장복산에 올랐다. 점심식사를 하는 아이들을 찬찬히 살폈더니 시험결과가 마음에 차지 않는지 낯빛이 밝지 않은 아이들이 더러 보였다. 편백나무 우거진 황톳길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야생으로 돌아온 짐승처럼 갑자기 힘을 회복하더니 목적지까지 단숨에 내달렸다. 그러고도 힘이 남았는지 옹기종기 모여 소리 질러 노래를 부르더니 신나게 춤까지 췄다. 아이들은 그렇게 시험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려주자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나무들은 어디로 가지를 뻗을까요?” 필자가 던진 질문에 남편이 답했다. “햇빛을 향해 남쪽으로 가지를 뻗겠지요.”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제주도에서 옮겨온 해송들은 모두 갯내음이 나는 바다를 향해 가지를 뻗고, 에밀 브론테의 ‘풍우의 언덕’ 속의 목사관 너머 삭막한 황야에 심겨진 소나무들도 모두 떠나온 숲을 향해 가지가 뻗었다고 한다.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그리운 곳을 향해 촉수를 뻗는다고 합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갈 것이고 아이들은 재빨리 어른이 될 것이다. 먼 훗날에도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추억하길 원한다면, 부부들이여, 오월에는 자녀의 손을 잡고 산에 한 번 오르시는 것이 어떨까. 공부한다며 억눌려 있는 아이들의 등을 두들겨 일으켜 세우고,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깃털이 다 자란 새처럼 어느 날 그들도 홀연히 둥지를 박차고 날아가겠지만, 고단한 세상사에 시달리며 외로운 순간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생기도록 말이다. 싱그러운 숲의 향기 속에서 서로 맞닿았던 체온과 땀 냄새가 세상 어느 곳에 살아도 그 가지를 뻗을 그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