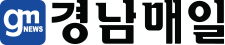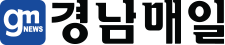가야문화축제가 열렸다. 거리에 깃발이 펄럭이고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뾰죽 지붕 텐트 아래 알록달록 갖가지 상품들이 진열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에 기분 좋게 흥청거린다. 삐에로처럼 분칠하고 단장한 엿장수는 연일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는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풍물소리도 지칠 줄 모르고 신명을 만들어 간다.
언제부터인가 축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풍물소리 어우러진 오광대 탈놀음이다. 광대들은 걸쭉한 대사와 몸놀림으로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탈놀음 판에서 탈을 다 없애준다는 것도 기분 좋다. 아슬아슬 장대에서 줄을 타며 재담으로 긴장과 웃음을 만들어가는 사람, 상모를 쓰고 자반뒤집기로 몸을 날리는 풍물패들로 축제의 흥은 절정에 치달았다. 유쾌함을 자아내는 오광대 탈놀음 판에선 신명을 이기지 못한 관객들도 한마당이 됐다.
‘덩덩쿵덕쿵’ 풍물소리가 들리면 사랑방 컴컴한 다락에 들어있던 검은 상모와 빨간 장구들이 떠오른다.
가을이면 집 뒤 대밭아래 커다란 돌감나무는 몇 가마니씩 빨간 감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깨지지 않고 성한 가을의 선물들을 모아 사랑방 다락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우리들의 겨울 간식이었다. 다락문을 열고 계단을 두어 개 오르면 입구에서부터 감이 쫙 펼쳐져 있다.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콕콕 눌러보아 홍시가 된 것을 하나하나 골라먹는 재미가 달콤했다.
다락문을 열면 달콤한 홍시냄새와 더불어 싸늘한 바람이 먼저 얼굴을 스쳤다. 캄캄한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처음 눈에 띄는 것은 감을 지키는 유령인 듯 빨갛고 까만 상모와 장구, 삼색 띠들이었다. 으스스한 한기와 함께 무서움이 왈칵 밀려들어 홍시도 제대로 못 고르고 도망쳐 나오기 일쑤였다. 홍시를 다 먹고 난 뒤에는 다락방엔 얼씬도 안했다.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우리 망천마을 어른들은 분주해졌다. 부정을 막는다고 입구 돌빡실엔 긴 소나무 장대를 두 개 세우고 새끼줄로 금줄을 쳤다. 새끼줄에는 대나무 가지들이 매달려 있었고 기둥아래는 황토 흙이 뿌려졌다. 돌빡실은 옛날 마을의 연자방아가 있었던 곳이다. 돌방아실이 어원이 변천돼 돌빡실이 됐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다.
사랑방의 다락을 차지하며 1년을 보낸 상모, 악기들이 드디어 햇빛을 봤다. 마을어른들이 흰옷에 빨강노랑초록의 삼색 띠를 매고 검은 상모까지 쓴 뒤 장구며 북을 치고 꽹과리 소리 따라 마을 집집마다 돌았다. 놀이패가 들어오면 그 집에선 정한 물과 쌀을 담아 촛불을 켠 상을 내고 절을 올린 주인은 쌀을 한 바가지씩 퍼줬다. 한 바퀴 마을을 돈 풍물패는 동네 가운데 넓은 마당에서 악을 치고 상모를 돌리며 마을전체의 액땜을 했다. 어른들을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우리들은 담벼락에 붙어 서서 악기소리와 몸을 날리는 풍물패의 재주를 간을 졸이며 지켜보곤 했었다.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악기들은 다시 우리 집 사랑방 다락에 떡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