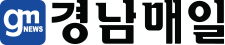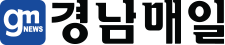필자가 어린 시절 지금은 없어진 마산 서성동 분수로터리 일대는 분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이 없는 말 달구지가 쉬던 장소였다. 인근의 청과시장에서 거래되는 청과물들을 실어나르던 말들이 싼 똥 냄새가 코를 막을 정도로 진동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이곳이 말 달구지가 사라지고 전화국건물이 들어서면서 여름이면 근처 주민들의 휴식처 구실을 했다. 저녁을 먹은 아녀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돗자리를 펴고 때로는 선잠을, 때로는 아이들과 대화를 즐겼다. 나는 돗자리에 누워 배터리를 불룩하게 갖다 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왕비열전’을 열심히 듣기도 했다. 누워서 본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빛났다.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지만 어머니를 통해 나는 웬만한 별자리는 알았다.
나의 10살 이전은 이렇게 여름밤이면 100여 명 가까이 모여든 전화국 앞 넓은 공터(광장)에서 별과 라디오, 어머니의 옛날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하면) 오벨리스크처럼 위용을 자랑했던 굴뚝이 허물어지고 이곳에 새로 길이 나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분수로터리가 생기고 차들이 달리면서 아낙네와 아이들의 자리는 사라졌다. 휴식처 구실을 하던 광장의 역할은 동네 골목이 대신했다. 골목마다 차려진 평상에서 아낙네들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뛰놀았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 어머니와 아이의 대화는 갈수록 보기 어려워졌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평상과 뛰놀던 아이도 골목에서 사라졌다.
현대의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공원을 만든다. 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단체장의 중요 임무가 됐다. 그러나 공원이라고 해봐야 어릴 적 광장과 골목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공원이라고 가봐야 기껏 산책로를 걷거나 운동기구 정도를 즐길 수 있을 뿐이다. 잔디 보호를 위해 공원면적 거의 전부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공원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그저 눈으로 보는 구경의 공간 성격이 짙다. 공원을 벗어나면 이마저도 사람이 쉴 공간은 없다. 골목은 물론 어지간한 공간은 차량이 독차지하고 있다.
인도가 넓은 창원시를 제외하면 길거리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지 쉬는 공간은 아니다. 차량들이 달리는 길옆에서 쉴 사람도 그다지 없겠지만 벤치 하나 볼 수 없다. 길을 가다 힘든 노인들이 잠시 앉아 쉴 공간이라고는 손수건만 한 여지도 없다. 아이들이 놀 공간도 학교운동장이 고작이다. 컴퓨터 앞에서 노는 아이들을 나무랄 여지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사람 중심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고용 등 경제 사회적 현안들에 집중돼 있을 뿐 사람을 위한 공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창원시가 시내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한 것이 눈에 띌 뿐이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 지친 다리를 쉬게 할 벤치 하나 변변히 없다는 것은 삭막하다 못해 잔인하다. 어린아이들이 집안 외에는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다.
교통흐름 위주의 도시정책에 변화를 줄 시기가 됐다. 카페가 아닌 길거리,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할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 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는 공원에 대한 고민도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