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라기 보다는 동생이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충희는 저 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에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충희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슬픔은 추억과 비례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 형제를 잃은 유족의 슬픔에 비길 바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충희 사고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끝없이 누군가를 향해 별탈이 없기를 빌면서….
하지만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가득 메우던 가족들의 절규, 동료들의 한숨섞인 눈물.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올 6월 입사할 때 충희가 생각납니다.
요즘 20대와 별반 차이없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넬 때만 해도 그냥 또 누가 입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일과 이후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됐고, 후배지만, 동생이지만, 참 배울게 많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조문객중 충희 출입처인 경찰간부 한분의 말씀이 떠 오릅니다.
“보통 누구 문상을 가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면 마지못해 가는 때가 많은데 이 기자의 경우는 다르다”구요.
이 간부 경찰은 “평소 내 방에 자주 왔어. 물어볼 게 많다면서. 늘 느꼈지만 참 성실하고 순박했어. 그래서 더 정이 갔는지도 모르지만. 참 애석한 일이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한 두 사람 정도만 이런 말을 하면 예의상 그렇게 말한다고 치부할 일이지만, 여러 문상객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커피 한잔 먼저 건네던 충희, 너무 선한 눈을 가져 사회부 기자로서 냉철해지라는 핀잔도 자주 들었던 충희….
남아있는 우리 모두 그런 그를 쉽게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보니 충희 책상 위에 국화꽃 한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커피잔이 한가득입니다.
그동안 충희에게 받아 마신 커피를, 먼저간 충희에게 바친 것일 겁니다.
망자를 너무 그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 여기서 충희에 대한 추억을 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배의 기자정신을, 선배들은 가슴속에 깊이 깊이 지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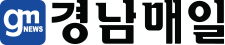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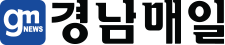


박세진 기자의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군요. 눈물이 핑 돌라고 하네요..
박세진 기자님 힘 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