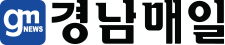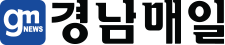올해 수확량은 420만t가량이다. 적정 수요보다 35만t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쌀 소비는 주는데 반해 생산은 반비례, 재고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늘거나 그대로인 데다 수입쌀까지 가세,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쌀이 남아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사상 최대치인 200만t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쌀 부족 시대의 ‘생산 장려’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하지만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에는 되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것도 당ㆍ정ㆍ청이 총리공관에서 가진 회의결과란 것에 씁쓸해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할 경우 쌀만 자급률이 웃돌 뿐 콩, 밀 등을 포함한 자급률은 50% 선이어서 가뜩이나 낮은 수준인 식량 자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 하락ㆍ난개발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라는 논란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쌀 공급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의 쌀 소비 확대 방안은 헛바퀴만 돌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쌀 가공식품 확대 △쌀 사료화 △대외 원조와 수출 증대 △저소득층 무상 지원 확대 같은 대응책을 내놨지만 원가 손실, 수요 한계, 외교ㆍ통상 문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의 대북지원, 아프리카 등 해외 원조, 가축사료로 사용하자는 제안, 저소득층 무상지원 등의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 종착역이 농지를 줄이지 않고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농지가 보전에 앞서 완화정책이 추진된다면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도시 주변 농지난개발을 부채질할 거란 우려도 비등하다. 절대농지 해제의 딜레마다. 농지 축소의 덫은 ‘식량 주권ㆍ난개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는 한번 줄면 다시 늘리는 게 어렵고, 농지 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쌀(101%)을 제외하고는 바닥이다. 보리쌀 22.3%, 밀 1.2%, 옥수수 4.1%, 콩 32.1%다. 쌀을 포함, 50.2%에 그칠 뿐이다.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정부가 대체작물 재배 등 다각도의 대책도 않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재고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만을 타개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ㆍ변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해제된 농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서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대체작물 재배 등 다각적인 대책에 우선하지 않고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까닥 잘못하다가는 무대책이 대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가 계속해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74.8점으로 26위를 기록해 2012년 21위, 2013년 24위, 2014년 25위에서 계속해 추락할 경우, 식량 주권이 위협받게 된다.
이 같은 실정에도 농업진흥지역 규제재검토는 도입된 1990년 이후 26년 만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전신인 절대농지 제도의 도입 시점(75년)을 감안하면 40여 년 만이다. 농지보전제도의 완화는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은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쌀 가격을 유지하고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절대농지 제도가 처음 도입된 75년 129.4㎏에서, 지난해 62.9㎏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을 줄이면 당장의 쌀 생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다른 밭작물의 생산까지 줄어드는 식량자급률(곡물 기준 23%)이 예상돼 쌀 문제 해결이 되레 식량 주권을 잃게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농산물 수입이 늘면 세계적 식량 파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노출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당정 방침대로 농민신청에 따라 완화할 경우, 농지는 개발열풍으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농민은 “60~70%인 부재(不在)지주만 이득을 얻고 피해는 농민들이다”란 것에서 비상시 수습조절을 위한 휴경보상제도 등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쌀(자급률 103%)만 넘쳐날 뿐 쌀을 포함, 전체 곡물식량자급률은 1985년(77.6%), 1995년(55.7%), 2005년(53.6%) 2015년(50.2%) 등 갈수록 줄고 있다. 때문에 쌀 산업의 합리적 개편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겠지만 농지는 보전이란 단수한 진리를 깨부술 경우 ‘식량 안보’는 물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중요한 가치는 한방에 훅 날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