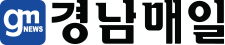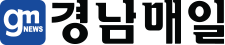서방님 생일인지는 어떻게 알고 하루 전부터 유난을 떠나. 팥밥과 미역국은 당일 해줘도 상관없는데 뭘 대단하게 차려주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잔뜩 기대를 누른 채 후각과 청각만 곤두세운다.
몇 해 전 아무도 이 가장의 생일을 기억하는 이 없어 조용히 석양에 묻혔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은 그때를 만회하기 위해 새벽잠까지 설치는구나. 등교준비를 하는 딸아이의 입에선 “엄마 맛있다”는 말이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야호’하는 등산객의 목소리처럼 우렁차다. 우와! 어쩐 일인지.
학교를 다녀오겠다는 인사가 현관문을 나간 지 한참이 지났어도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묵묵하다. 입 밖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용언들이 혀끝을 콕콕 찔러도 모른 척하는 것도 준비된 이벤트를 위한 과정이라며 목석이 되기로 했다. 짠하며 축포를 터트리기까지.
운동을 가려고 주섬주섬 운동복을 챙기는 아내 옆 식탁 위엔 밤새 내려앉은 적막뿐이다. 도대체 무얼 만들었가애 칼과 도마가 춤을 췄을까.
이 녀석은 뭘 먹었기에 맛있다고 했을까.
서서히 개봉할 때도 됐건만 정녕 애간장을 이토록 태운단 말인가.
경상도가 고향이 아니랄까 봐. 살짝 귀띔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배가 고파도 고프다 못 하고 엉덩이가 뜨거워도 뜨겁다 않던 옛 양반님들처럼 헛기침만 하고 있으려니 고문이 따로 없다.
진득한 사람이 돼보려 삭신을 꼬는 귓전에 개나리 같은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참 오래도 기다렸다. 꼭 이렇게까지 진을 빼야 기대 반 고대 반 테이프를 끊고 케이크를 자르나.
“그런데 이게 웬걸.” 오늘 에어로빅 회원들이랑 점심 회식이 있어 자기가 먹기 좋게 유부초밥을 싸놓았다며 포일을 씌워 다소곳이 건넨다. 장식으로 물 한 컵까지 준비하는 감각도 잊지 않고.
“아! 그럼 이걸 만드느라….” 그럼 혼자 상상의 나래를 폈단 말인가.
지금까지 들뜬 마음은 초밥에 뿌려진 식초처럼 시큼해졌다. 식초가 첨가된 음식을 유독 싫어하는데 초를 잔뜩 치다니 팥밥과 미역국이 멀찍이서 아롱거린다. 시그러운 맛에 치를 떨며 아침 겸 점심을 초밥으로 때우고 저녁이 돼 몇몇 회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는구나. 오전 내내 풀이 죽었던 마음이 또다시 파릇파릇 되살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