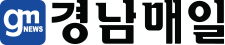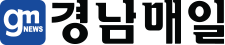시대에 “과학적이지 않다”고
얼버무리는 일은 무책임하다.
과학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신의
입김이 들어가야
사람의 삶이 온전해진다.

과학과 신이 별 탈 없이 잘 지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과학이 만능인 시대에 신은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될 수 있고, 과학이 못 메꾸는 영역에 신이 들어가면 딱 아귀가 맞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브라운은 가장 앞장서서 신과 맞서는 작품을 연거푸 출판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엔 ‘오리진(ORIGIN)’를 펴내 신이 과학의 도전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진화한다는 이야기가 그럴싸하다. 댄 브라운은 성경 창세기의 핵심인 창조론을 우화로 보기 때문에 그의 과학 영역에 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과학과 신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한 사람들은 많다. 과학에 의해 무참히 꺾인 근본적인 인간 문제를 신의 손으로 푸는 시도다. 인간의 인지력이 끝을 향해 가면 만나는 게 과학일까, 신일까는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무신론에 바탕을 둔 인간 정신의 황폐함을 내세우고 신과 함께할 때 실질적 행복이 온다고 짚었다. 신이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쓸 때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되묻는 질문에 쉬운 답을 내기도 어렵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신에 도전하는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맞을지에 대한 논쟁거리를 이미 던졌다. 그의 책에 나오는 ‘신이 된 인간’은 나아가는 길에 나타나는 불멸과 행복, 신성의 영역을 차례로 정복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가 깨지고 행복을 쉽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열매로 본다면 이런 상상은 짜릿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간이 신성의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여하튼 인간이 신과 비슷한 위치에 다다른 건 분명하다. 신은 언제가 인간이 불경죄를 짓고 자신의 자리에 앉을 것을 알고 종말의 개념을 알려줬는지 모른다.
신과 인간이 혼동하는 시대에 “과학적이지 않다”고 얼버무리는 일은 무책임하다. 과학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신의 입김이 들어가야 사람의 삶이 온전해진다. 물론 이런 시각에 반기를 들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류는 역사를 만드는 첫 출발부터 전설의 땅을 만들었다. 신화를 만들어 신의 영역을 동경했다. 인간과 신을 서로 떼놓으면 인간은 무한정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자문하면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드물다. 사람은 뒷전이고 거대한 시스템이 사람보다 우선하면서 사람이 한구석에 밀쳐지는 경우가 잦다. 인간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풍조는 천박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간 고유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없다면 인간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나. 두 탈출구가 있다. 과학과 신의 문이다. 과학이 실존을 최대한 끌어올린 자리에 있다면 신은 실존에 매이다 허물어지는 인간 본성을 지탱하는 자리에 있다. 과학과 신이 손을 잡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살만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신이 된 인간’은 과학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신이다고 할 테니까.
요즘 신의 자리에 ‘신이 된 인간’이 앉으려는 게 대세다. 사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시대에 인간이 신이 되고 영원을 탐하는 자리까지 올라서려 한다. 과학과 손을 잡은 인간은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인류의 오리진(기원, 시작)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는 각자의 몫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그 오리진에서 신을 완전히 떨쳐 내버릴 때 우리 주위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쫙 깔릴지도 모른다.